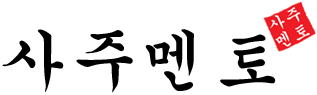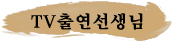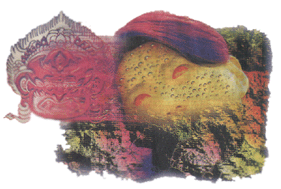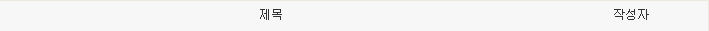비오는 밤의 요괴 소동 --- 스포츠조선 연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본문
끼이익.
"야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
급브레이크를 밟은 택시기사 이씨(39)는 벼락같이 소리를 내지르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기사 양반. 뭘 갖고 그러십니까?
어서 빨리 갑시다."
"예? 아니 저기 뛰어가는 놈 말이예요.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잖아요."
뒤에 타고 있다가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던 중년 부부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이씨를 재촉했다.
"누가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네?"
차 앞에는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부슬부슬 봄비만 내리고 있었다.
'아니 내가 헛것을 봤나?'
이씨는 운전 경력 15년의 베테랑 기사였다.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젠장. 간밤의 꿈에 누가 나더러 자꾸 어딜 가자더니. 귀신한테 홀렸나?'
사실 이씨는 손님인 중년 부부가 경기도 금촌 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갈까말까 망설였다.
비오는 밤에 멀리 외진 곳으로 가자니까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아니 목적지가 상가(喪家)였잖아. 비는 계속 오고, 어째 으시시한데.'
손님을 내려주면서도 있는 기분이 떨떠름했다. 정말 괜히 왔다 싶었다.
호젓한 교외, 초상집, 부슬부슬 내리는 비….
게다가 허깨비 소동 같은 황당한 일로 급브레이크까지 밟지 않았던가.
이씨는 자신이 '무덤에서 나온 신랑' 같은 공포영화 분위기 속으로
빠져든 것 같아서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통일로는 그날 따라 차량도 뜸했다.
잔뜩 긴장된 이씨는 룸미러도 쳐다보기 싫었다.
벽제를 지나기 전 이씨는 소변이 몹시 마려웠다.
참다못해 이씨는 논 옆에다 차를 세웠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어둠 저편에서 뭔가 달려나올 것 같았다.
'기분 탓일 거야. 뭔 일 있을라구.'
그 순간 논둑 저편에 희끗희끗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얼핏 봐선 누군가 아씨처럼 '실례'하는 폼이었다.
'그래 급하면 체면이 어딨어.'
이씨는 비슷한 처지의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어어어….
오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다.
적어도 몇 분은 지난 것 같은데도 오줌이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
이씨는 공포의 늪으로 깊이 빠졌다.
'가만, 저 남자. 왜 논 한가운데로 들어가 오줌을 누고 있지?'
이씨는 다시 한번 멀리서 실례하는 남자를 확인하기 위해 쳐다봤다.
그러나 갑자기 남자는 없어졌다. 그 자리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씨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 자신을 툭 치고 스쳐 가는 느낌이 들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제서야 소변도 멈추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씨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픈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삼송리 입구를 지나올 때도 길가에서 웬 남자가 손을 들었으나,
이씨는 조금 전에 사라졌던 남자 생각이 나서 태우고 싶지 않았다.
그냥 지나치면서 흘낏 사이드 미러로 봤더니
그 남자는 뚫어지게 이씨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다음날. 이씨는 아내가 깨우는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다.
아내는 한낮이 됐는데도 남편이 일어나지 않자 흔들어대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웬 일인가?
이씨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
"아니 웬 땀을 그렇게 흘려요?"
순간 이씨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잇달았다.
"아 악, 여보, 나 못 일어나겠어."
더 놀란 쪽은 부인이었다.
등 쪽을 밀어 일으키려는데 땀으로 범벅이 된 남편은
아프다는 비명만 지를 뿐 도무지 일어날 줄을 몰랐다.
119 구급차까지 달려왔다.
"남편이 갈수록 심하게 아프다고 외쳐대니, 어떡해요?"
그의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보자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씨 아내로부터 전후사정을 듣고 보니 '요괴'의 장난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씨가 논에서 본 남자는 요괴가 만든 헛것이었고,
그 요괴가 이씨의 눈을 현혹하는 사이 날아다니는 살(煞)을 맞은 것 같았다.
나는 일단 급한 대로 급살퇴치부를 한 장 써준 다음,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서 불사르라고 했다.
워낙 세게 맞은 살이라 시간이 꽤 걸렸다.
첫날은 끙끙 앓는 소리가 들어간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3일째 되는 날. 앞가슴과 등과 허리 세 곳에 부적을 부치자
이씨의 몸에서 누런 땀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살(煞)이 녹아 내리는 것이었다. <끝>
"야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
급브레이크를 밟은 택시기사 이씨(39)는 벼락같이 소리를 내지르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기사 양반. 뭘 갖고 그러십니까?
어서 빨리 갑시다."
"예? 아니 저기 뛰어가는 놈 말이예요.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잖아요."
뒤에 타고 있다가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던 중년 부부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이씨를 재촉했다.
"누가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네?"
차 앞에는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부슬부슬 봄비만 내리고 있었다.
'아니 내가 헛것을 봤나?'
이씨는 운전 경력 15년의 베테랑 기사였다.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젠장. 간밤의 꿈에 누가 나더러 자꾸 어딜 가자더니. 귀신한테 홀렸나?'
사실 이씨는 손님인 중년 부부가 경기도 금촌 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갈까말까 망설였다.
비오는 밤에 멀리 외진 곳으로 가자니까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아니 목적지가 상가(喪家)였잖아. 비는 계속 오고, 어째 으시시한데.'
손님을 내려주면서도 있는 기분이 떨떠름했다. 정말 괜히 왔다 싶었다.
호젓한 교외, 초상집, 부슬부슬 내리는 비….
게다가 허깨비 소동 같은 황당한 일로 급브레이크까지 밟지 않았던가.
이씨는 자신이 '무덤에서 나온 신랑' 같은 공포영화 분위기 속으로
빠져든 것 같아서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통일로는 그날 따라 차량도 뜸했다.
잔뜩 긴장된 이씨는 룸미러도 쳐다보기 싫었다.
벽제를 지나기 전 이씨는 소변이 몹시 마려웠다.
참다못해 이씨는 논 옆에다 차를 세웠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어둠 저편에서 뭔가 달려나올 것 같았다.
'기분 탓일 거야. 뭔 일 있을라구.'
그 순간 논둑 저편에 희끗희끗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얼핏 봐선 누군가 아씨처럼 '실례'하는 폼이었다.
'그래 급하면 체면이 어딨어.'
이씨는 비슷한 처지의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어어어….
오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다.
적어도 몇 분은 지난 것 같은데도 오줌이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
이씨는 공포의 늪으로 깊이 빠졌다.
'가만, 저 남자. 왜 논 한가운데로 들어가 오줌을 누고 있지?'
이씨는 다시 한번 멀리서 실례하는 남자를 확인하기 위해 쳐다봤다.
그러나 갑자기 남자는 없어졌다. 그 자리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씨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 자신을 툭 치고 스쳐 가는 느낌이 들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제서야 소변도 멈추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씨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픈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삼송리 입구를 지나올 때도 길가에서 웬 남자가 손을 들었으나,
이씨는 조금 전에 사라졌던 남자 생각이 나서 태우고 싶지 않았다.
그냥 지나치면서 흘낏 사이드 미러로 봤더니
그 남자는 뚫어지게 이씨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다음날. 이씨는 아내가 깨우는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다.
아내는 한낮이 됐는데도 남편이 일어나지 않자 흔들어대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웬 일인가?
이씨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
"아니 웬 땀을 그렇게 흘려요?"
순간 이씨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잇달았다.
"아 악, 여보, 나 못 일어나겠어."
더 놀란 쪽은 부인이었다.
등 쪽을 밀어 일으키려는데 땀으로 범벅이 된 남편은
아프다는 비명만 지를 뿐 도무지 일어날 줄을 몰랐다.
119 구급차까지 달려왔다.
"남편이 갈수록 심하게 아프다고 외쳐대니, 어떡해요?"
그의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보자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씨 아내로부터 전후사정을 듣고 보니 '요괴'의 장난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씨가 논에서 본 남자는 요괴가 만든 헛것이었고,
그 요괴가 이씨의 눈을 현혹하는 사이 날아다니는 살(煞)을 맞은 것 같았다.
나는 일단 급한 대로 급살퇴치부를 한 장 써준 다음,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서 불사르라고 했다.
워낙 세게 맞은 살이라 시간이 꽤 걸렸다.
첫날은 끙끙 앓는 소리가 들어간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3일째 되는 날. 앞가슴과 등과 허리 세 곳에 부적을 부치자
이씨의 몸에서 누런 땀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살(煞)이 녹아 내리는 것이었다. <끝>
- 이전글마귀들의 협박 --- 스포츠조선 연재 12.08.14
- 다음글50X호의 공포.3 --- 스포츠조선 연재 12.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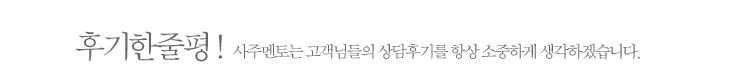 | ||||
|